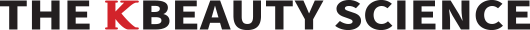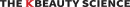『인류의 운명을 바꾼 약의 탐험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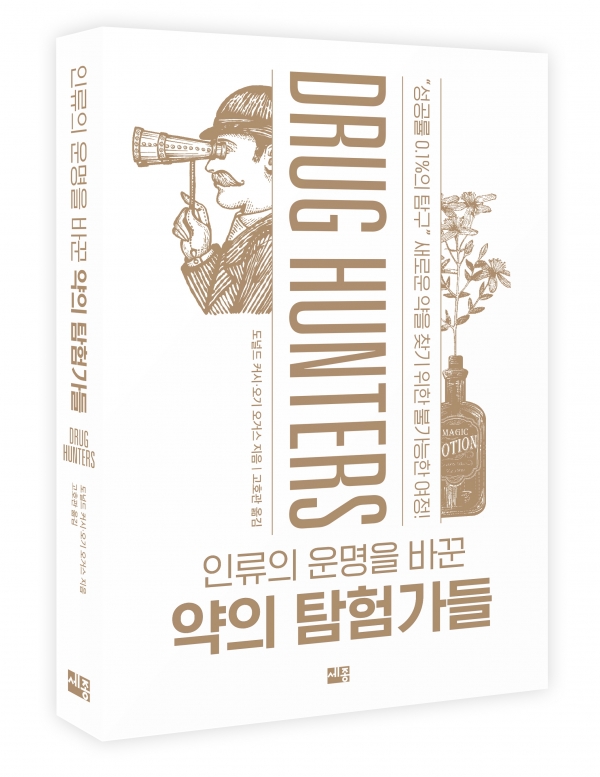
[더케이뷰티사이언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르헨티나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바벨의 도서관』은 우주를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나가는 무한한 육각형 방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이라고 상상한다. 각 방은 책으로 가득차 있고, 각 책에는 무작위로 나열한 문자가 담겨 있다. 그 어떤 책도 다른 책과 똑같지 않다. 순전히 우연에 따라, 아주 가끔 ‘금은 산속에 있다’처럼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담긴 책이 있다.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배열, 허튼소리,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에는 순전한 우연에 따라, 삶을 바꾸어 줄 명료한 지혜가 가득한 책도 있다. 그런 책은 ‘변론서’다. 도서관 사서라고 불리는 고독한 탐색자들은 끝없이 도서관을 방랑하며 변론서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현대의 신약 사냥꾼은 사서와 같다. 제대로 된 약을 결코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은밀한 두려움을 억누르며 삶을 바꾸어줄 물질을 찾아 영원히 헤맨다. (27~30쪽)
저자는 이 책에서 약 사냥꾼(drug hunters)과 신약 개발 과정을 전면적으로 탐구하면서 식물의 시대부터 합성화학을 거쳐 전염병 의약품 시대별로 각 분야의 원조가 된 의약품이 탄생한 과정을 알려준다. 원제는 『THE DRUG HUNTERS』다.
이 책을 쓴 도널드 커시(Donald R. Kirsch)는 제약 관련 특허 24개를 보유하고 있는 신약 연구자다. 와이어스, 시안아미드, 스큅, 캄브리아 파머슈티컬즈에서 연구팀장, 최고과학책임자, 바이오·제약 업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하버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약 개발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오기 오거스(Ogi Ogas)는 전문 과학 작가다.
저자는 신약은 합리적인 연구과정을 거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우연’과 ‘운’, ‘시행착오’의 결과였다고 말한다. 즉, 『바벨의 도서관』 사서처럼 신약 사냥꾼은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 ‘발견’하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유익한 분자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이론이나 원리를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몸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33~34쪽)거나 “근대 과학 이전의 신약 사냥은 단순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했다. 요즘은 체계적인 과학연구에 기반한 신약 개발 계획의 열매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다. 21세기에도 신약을 찾는 근본적인 기술은 5000년 전과 똑같다. 끈질기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화합물을 조사하며 그중 하나, 단 하나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22쪽)이라고 설명한다.
더구나 “신약 산업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건 원래 찾아 헤매던 약을 정확히 찾아내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의사의 능력으로는 5%의 경우에만 환자에게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신약을 찾는 과학자가 차이를 만들어낼 확률은 0.1%에 불과하다”(25쪽)는 것이다.
심지어 “상당수의 중요한 약은 그 약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불편한 사실이다. 신약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자들이 알아내는데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다.”(264쪽)
물론 식물 성분, 합성 화학, 토양의 미생물, 동물의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등 탐색의 대상과 제조 방법은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약이 나올 때까지 임상 시험이 제대로 의무화된 것은 1938년이었다.
돈도 많이 든다. 대형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 하나를 만드는 데는 평균 15억 달러가 들고 14년이 걸린다. 약이 비싼 이유다.(25쪽) 저자는 거대한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따라다니기 쉬운 바이오 산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돈이 될 만한 신약 연구에만 뛰어드는 제약회사들을 꼬집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쯤되면 신약은 ‘희망 고문’ 산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저자는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토시 오무라(大村智)의 말을 빌어 신약 개발에 관한 철학을 소개했다. 사토시 오무라 박사는 1986년 자신의 신약 개발 철학에 관한 글을 썼다. “연구에 관한 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런 성과는 △미생물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신뢰 △원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스크리닝 시스템 확립 △스크리닝이 단순한 일상적 작업이 아니라는 인식 △기초 연구에 대한 강조, 그리고 △좋은 인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을 통해 얻어낸 것이다.”(14쪽)
사토시 오무라의 최고 업적은 이버멕틴(Ivermectin)에 관한 연구다. 그가 발견한 물질로 토대로 기생충약인 이버멕틴이 개발됐다. 일본은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이버멕틴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태생의 파울 에를리히(매독 치료제를 개발한 노벨상 수상자)는 신약 발견의 필수 요소로 4G를 제시했다. Geld(돈), Geduld(인내심), Geschick(창의력), Glück(행운)이다. 저자는 “에를리히의 공식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다. 돈, 인내심, 창의력, 그리고 많은 행운은 오늘날까지 신약 발견의 필수 요소”(115쪽)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신약 탐험의 내밀한 에피소드도 가득하다. △인류를 구원한 돼지의 묘약 △최초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서 돈벼락 맞은 염색회사 △세계 최초로 충치를 고통 없이 뽑아내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치과 의사 △아스피린을 발견한 유대인 화학자가 집단 수용소에 갇힌 동안 독일인 조수가 발견자로 둔갑한 음모 △고혈압은 병이 아니었던 시대에 역학 연구 덕분에 빛을 본 고혈압제 △프로이트 때문에 약으로 정신을 고친다는 생각이 배척받던 시대에 우여곡절 끝에 약으로 인정받은 조현병약 △시행착오 끝에 우연히 발견됐지만 아직까지도 작용 기전을 모르는 우울증약 △침입자 곤충을 물리치기 위해 식물이 만든 방어용 화학물질, 양귀비의 아편 등 제약 산업에서 35년 동안 일한 저자가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녹여냈다. 당시 제약 산업에 몸담은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다.
스위스 낙농업자, 기이한 외톨이 수의학 교수, 업계에서 외면당한 유대인 연구자, 여성 해방론자와 억만장자 할머니, 독실한 가톨릭교도 부인과 의사 등이 만든 피임약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담겨 있다.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John Snow, 1813~1858)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는 1854년 런던에서 창궐한 콜레라의 원인을 독창적인 조사 방법으로 밝혀냈다. ‘지도와 인구’ 모두에 초점을 맞춘 방식이었는데, 전염병이 퍼지는 패턴을 연구하는 과학인 '역학'의 첫 사례다. 오늘날 존 스노우는 역학의 아버지로 여겨진다.(210쪽)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시행착오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 시도하고 실수를 범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 낼 수 있다”면서 “제약산업은 ‘불확실성’에 바탕을 두고 움직인다. 대형 제약회사도 과학자가 신약 개발 과정을 창조적으로 관리하게 해준다면 세상을 바꿀 자신만의 ‘변론서’를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291~293쪽)
[도널드 커시·오기 오거스 지음/고호관 옮김/세종서적/344쪽/1만7000원]